은하수가 있는 마을, 사람의 마음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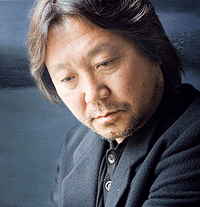
건물들의 맨 꼭대기. 더 이상은 오를 수 없는 곳에 그의 작업실이 있다. 창을 열면 바로 그가 즐겨 그리던 그림의 풍경이다. 건조하고 하염없이 외롭다. 한 그루의 초록 가득한 나무가 선연한 모습으로 눈앞에 심어진다.
빼곡한 골목 길 사이사이로 아직도 기와를 얹고 있는 낮은 지붕들이 위태로워 보인다. 작가의 작품 중 하나인 ‘별 내리는 신창동’이나 ‘은하수가 있는 마을’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한 곳이다.
작업실 안은 그림으로 켜켜이 접어져 있다. 여기저기 시간을 달리한 그의 작품들이 그가 얼마니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암암리에 눈빛으로 전해준다. 작품 안 꽃들은 빛을 발하고 나무들은 보이지 않는 바람결에 하염없이 우수수 소리를 내는데 우울하다. 짜내면 두 손 가득 외로움이 툭툭 떨어질 것만 같다.
예술가로 산다는 것 - ‘Wander star’
유년 시절, 교사인 선친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다. 시골 곳곳을 누비다 시피 거주한 작가는 하늘과 바람과 별, 꽃, 구름과 친구가 되었다.
영문학을 전공하셨던 선친께서는 시를 쓰셨고 ‘새 벗’이라는 잡지의 창간호 주간을 지내기도 했다. 작가는 시(詩)를 가까이 하고 늘 천형(天刑)처럼 시를 등에 업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선친의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일 거라고 말한다.
학창시절에는 문학을 꿈꾸었다. 선친처럼 시를 쓰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 사람들을 작가를 음유시인이라고도 부른다. 피아노를 즐겨 연주하기 때문이며 외로움이 극한일 때 작가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신에 대한 처방이다.
지금도 그의 작업실에는 시집이 작품들 사이 곳곳에서 즐겨 치는 피아노와 함께 한 몸처럼 공간을 둥둥 떠다니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그림을 시작한 그는 민중미술이 전무하던 유신 말에 대학생활을 하며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는 그림에 시대의 고통과 고민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작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노래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시대를 표현하지 않는 작가는 작가로서 생명력이 없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미술교사가 되던 첫 임지인 순천에서 살아온 신념대로 그는 당연히 민중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 ‘찾는 미술’이라는 장터전도 열며 예술이 ‘가진 자(者), 있는 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층민중의 삶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민중의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렸다.
90년 광주로 자리를 옮기면서 내면적 풍경화에 천착하기 시작한다. 기층 민중의 생활 속에서 찾아 온 예술성만이 아닌 그들의 삶 안에 더 깊이 침잠함으로서 얻어진 내면의 정제였다.
다시 한 번 자신의 예술세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암울한 상황에서 그린 꽃이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화가는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의 작품은 현실 참여적이면서도 매우 정제된 모습을 보여준다. 가난하고 억압받은 민중의 모습이지만 격하지 않고 문학적인 오히려 섬세한 작품들이다.
살아있는 그대가 바로 피어나는 꽃

2008년 올해 역시 광주시립미술관 5월 기획전과 서울 아트페어에 참가 예정이며 4월17일부터 25일까지 예술의 거리에 있는 나인갤러리에서 ‘푸른 저녁이 있는 마을’ 기획 전시를 앞두고 있다.
별, 바람, 나무, 마을 등 일상의 풍경들을 소재로 명상적이고 동양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문학 작품 같은 그림으로 ‘그대가 꽃인 줄 모르고’, ‘늙은 매화와 달’, ‘떠돌이 별’ 등은 짙은 서정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암울한 민중들의 삶과 세상의 풍경을 서정시학으로 표현해 온 작가의 작품들은 ‘Wander star’처럼 음울한듯 하면서도 빛과 어둠의 극적대비가 특징이다. 어딘지 모르게 가라앉아 있는 깊이가 쓸쓸하고 담백한 느낌을 부여해주며 그리움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작가 한희원 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차례 개인전과 수백회의 국내외 초대, 기획전 등에 참여했다. 현재는 지역 미술그룹 ‘새벽’ 회장 등을 맡아 배달하는 미술지인 ‘새벽신문’을 부정기적으로 발간하기도 한다.
새벽신문은 전국의 컬렉션과 큐레이터에게 보내져 이 지역 역량 있는 작가들의 홍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다리, 새벽회, 무등회, 전업미술가협회 등의 회원이다.
에필로그
‘내 세상 뜨면 풍장 시켜다오/섭섭하지 않게/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중략)/남몰래 시간을 떨어트리고/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무연히 안보이듯 바라보며/살을 말리게 해다오/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조각도/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바람 이불처럼 덮고/화장도 해탈도 없이/이불 여미듯 바람 여미고/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바람과 놀게 해다오’
돌아오는 길에 ‘황동규’의 ‘풍장(風葬)’이란 시가 입가에 떠오른 것은 왜일까. 그의 그림 안에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서 있는 한 그루 나무가 작가의 분신처럼 느껴진다. 다시 태어난다면 들판에 서 있는 무성한 한그루 나무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외로웠기도 했지만 삶을 이어가는 가파른 능선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치열하게 산다는 것은 그만큼 회한이 많다는 것이다. 돌아보지 않기 위해 앞만을 보고 걷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쓸쓸해서다. 더 이상은 외로워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일시 : 4월17일~25일까지
장소 : 궁동 나인갤러리
문의 : 062-232-4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