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몸짓이 보인다. 톱밥 가득한 실내가 보이고 지붕 위로 쉬지 않고 돌아가는 통풍기가 보인다. 통풍기는 바로 그 자신이다.
일 하는 시간동안, 흘리는 땀의 양만큼 통풍기는 노래로 돌아가 그와 하루를 매번 같이 한다. 통풍기는 그에게 있어 가장 신선한 산소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노동하는 것이라고 일찍이 박노해는 말했었다.
임 홍수씨 역시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은 땀 흘려 몸으로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며 혁명가로 살고 싶었다”고 말한다.
쉬지 않고 달려왔다. 프레스 공으로, 청계 피복 노동자로, 사출기, 용접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땀 흘려 노동하며 자신의 건강한 삶을 꾸려 왔다.
화가와 목수, 가구의 인연
입학과 동시에 군 입대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집 안이 궁핍했다. 제대 후 돌아 온 학교 역시 그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었다.
굳이 80년대의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그가 선택한 것은 현장이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다. 노동자로 살고 싶었다. 아니,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후회를 한 적도 없다”는 그의 눈빛에 회한이 담긴다. 서늘한 눈빛이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여전히 그림은 그에게 인연의 끈을 버리지 못하는 화두였고 그런 열정으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었다. 몇 개 월 간의 대학 생활에서보다 노동자로 살아 온 삶이 그림에 서정으로 녹아들어 그의 그림을 완전하게 보이게 한다.
“화가는 아니다. 난 가구를 만드는 목수다”고 목소리 높여 말하지만 그 역시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다.
먼지처럼 떠돌며 흐르던 시간이 모이고 모여 나무를 만났고 지금의 자리에 정착한 지 6년이 넘었다. “택시 운전을 하다 만난 가구 만들기는 그나마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내게 창작할 수 있는, 무엇을 손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구를 잠재워 주었다”고 말하는 그는 창작행위를 결코 놓을 수 없는 작가가 맞다.
민중미술화가인 이준석씨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후배”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다.

이제 십 년이 넘어버린 전시회
1996년과 2000년 두 번의 개인전이 전부다. 하지만 그의 그림을 보면 두 번의 전시회가 그리 녹록치 않음을 알게 한다. 현장에서 녹아든 삶 자체가 그림에 그대로 살아나 그가 그린 그림과 판화에는 애잔함이 느껴진다.
삶의 고통이나 두려움 보다는 외로움, 쓸쓸함, 어찌 해볼 수 없는 깊은 서러움이 보인다. 아니 온 몸에 느껴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다.
96년 작인 목판화, ‘겨울여행’은 화면을 가득 메운 새떼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등이 보인다.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에 옷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남자는, 네덜란드 애니메이션 마이클 두독 데비트(Michael Dudok de Wit) 감독의 <아버지와 딸>(Father and Daughter)을 연상 시킨다.
인물은 작지만 배경은 크게 보여주는 공간 활용이 극대화되어 얼굴 표정조차 알아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체적인 느낌으로 감정의 섬세한 흐름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세세한 표현보다도 단지 검정 잉크만으로도 느낌은 훨씬 강렬하다.
그것만이 아니다. ‘소리 없는 항해’와 ‘청빈낙도’ 역시 작가가 살아 온 시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리 없는 항해’에서 파도치는 삶의 굴곡들을 홀로 건너는 행위는 두려움 그 자체였지만 절대 멈추지 않은 채 그래도 가야만 하는 것이 삶이라면 ‘청빈낙도’에서는 비워버린 마음 한쪽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익숙해 질 정도가 되었다.
홀로 방안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마당 뒤편, 우거진 대나무를 바라볼 삶에 혜안도 생겼다.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삶 안에 홀로 우뚝 선 것이다.

마이더스 손, 가구의 모든 것
“사람들이 목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나무가 주는 안정감과 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품격, 향기, 연륜 등이 그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이 원하는 가구를 설계한다. 나무를 재단하고 조립하며 마지막으로 완성된 가구에 염색을 하며 그의 생각은 하나다. 가능하면 온전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구를 만드는 것이다.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작가가 스스로 ‘완성이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작업장 안을 벗어날 수 없다. 그만의 고집이 지금의 그를 있게 했다.
침대, 식탁, 의자, 각종 책장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구를 만들어낸다.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편리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개성을 느끼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내 삶은 풍요롭다”는 그는 마이더스 손을 가진 영원한 청년 노동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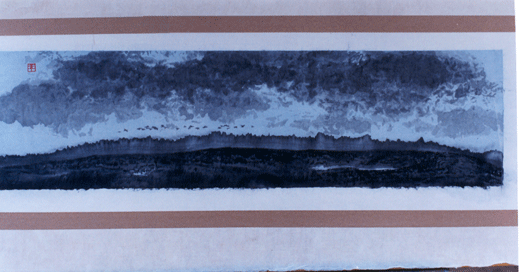
에필로그
그의 그림에는 시(詩)가 새겨져 있었다. 그가 직접 쓴 시다.
‘지난날의 노동은 / 푸른 솔 잎 끝 / 새벽이슬에 선 / 아침 햇살의 반짝임만큼이나 / 맑고 아름다운데 / 나의 사랑은 요원하기만 하다 // 어느 꽃피는 봄날의 맺은 / 사랑의 언약은 / 무덥던 여름날 / CO2 용접 불꽃처럼 정열적이고 / 청춘을 불태워 사랑한 / 노동 해방 세상의 빛나는 꿈이었다 // 쓰러져간 전사의 거친 숨소리 / 아직 귓전에 맴도는데 / 오늘 나의 사랑이 /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 한다 // 사랑은 내 안에 있지만 / 더 이상 나의 사랑이 아니다 / 꿈은 죽지 않았지만 / 그 꿈은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떠나지 못하고 / 그냥 그곳에 서 있을 뿐...’
작가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자신을 꼭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생각하며 미루어 두었던 사랑을 이제는 더 놓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시 그림을 그리려 붓도 깨끗이 빨아 두었다.
떠나지 못하고 머물기만 했던 자리에서 작가는 이제 더 굳건하게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고 꿈을 키우며 사랑을 키워낼 예정이다. 그의 사랑은 이제부터 더 타오를 것이다.
문의 : 062-672-0882
| ▲ 임홍수 작가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중퇴. 1996년 1회 개인전-광주 빛고을 갤러리. 2000년 2회 개인전-서울 종로갤러리, 광주 무등 예술관. 그 외 단체전 다수. 민미협 회원, 민예총회원. |


